https://gujoron.com/xe/?mid=gangron&search_keyword=%ED%99%98%EC%9B%90&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1229036
(환원주의와 엔트로피)
이 글에서 학문의 분류와 환원 구조를 참고하였습니다
환원 구조란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종속시키는 비대칭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보면 지구는 태양을 종속시킬 수 없지만
태양은 지구를 종속시킬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지구는 태양에게 환원됩니다
학문도 이러한 환원 구조를 가지는데
깔때기 구조로 보자면
제일 먼저 구조론이 있고
구조론 안에 수학이 있고
수학 안에 물리학이 있고
물리학 안에 화학이 있고
화학 안에 생물학이 있고
생물학 안에 뇌과학이 있고
뇌과학 안에 심리학이 있고
심리학 안에 사회과학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 이유는 상위 학문을 통해 하위 학문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공학에서 상위 학문인 뇌과학을 배워 제대로 응용해먹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문은 이러한 환원 구조를 가지는데
지능 또한 이러한 환원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입니다
다중 지능 이론을 참고하면
언어지능, 수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운동지능, 대인지능 등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전한길의 암기를 잘하는 지능은 환원 구조상 낮은 영역에 있을 거라 추측을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양한 지능을 환원 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능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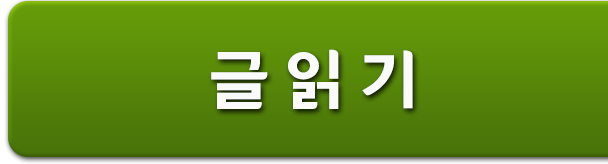







 김동렬
김동렬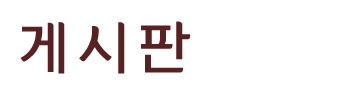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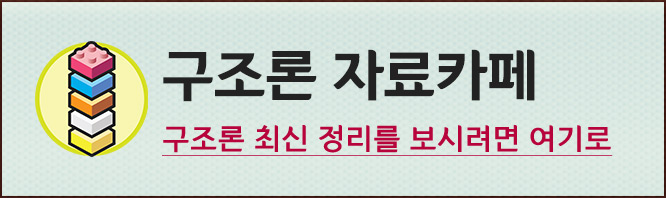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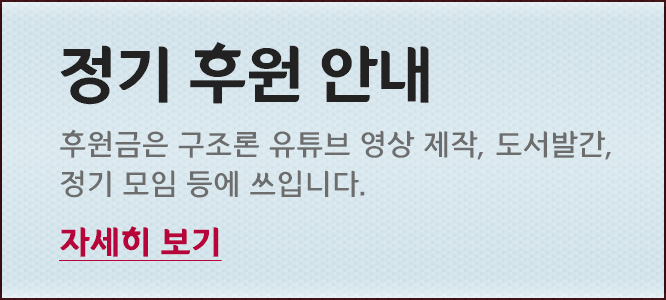


지능은 환원시킬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말을 잘하는데
말을 잘해서 말이 많지만 그게 똑똑한건 아닙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말하는듯 한데 대략 개소리로 보입니다.
실존지능, 자연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별 개소리가 다 있네요.
구조론은 뭘 줄이는 마이너스로 가야지 늘리는 열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지능의 종류가 백가지 나옵니다.
언어능력과 단기기억능력, 추론능력 하나로 승부해야 합니다.
언어능력이 없으면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기기억능력이 없으면 모형적 사고를 못하고
추론능력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언어능력으로 이름을 붙여서 머리에 띄운 다음
단기기억능력으로 그것을 전두엽에 올려놓고
추론능력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하는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패턴을 감지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그건 이름이 아예 없네요.
1. 패턴을 감지한다. 기계적으로 반응이 온다.
2. 발견한 패턴에 긴장하고 집중한다. 뇌가 흥분한다. 호르몬이 나와야 한다.
3. 패턴에 적절한 이름을 붙인다.
4. 패턴을 단기 저장하고 이것저것 건드려 본다.
5. 우선순위를 바꾸어 또다른 패턴을 만들어낸다.
구조론의 핵심은 완전성이고 완전성은 패턴의 모형입니다.
위에 열거한 무슨무슨 지능들은 보조재고 지능의 핵심은 하나 뿐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어색함을 느낀다거나
뭔가 밸런스를 느끼는 능력이 있고
예컨대 규율, 규정, 규칙, 규범, 규격, 규모, 규명 중에서 어느게 자연스러운가?
글쟁이라면 단어들 간의 미묘한 느낌 차이에 예민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음악이나 미술이나 대인관계에서
그런 자연스러움과 어색함을 느끼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컨대 길치라든가.. 방향치는 길에서 자연스러움을 못 느끼는 것.
이것이 지능의 본질일텐데 이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함.
1. 지능의 본질은 자연의 패턴에 반응하는 능력이다.
2. 미술, 음악, 대인관계, 길치, 역사, 개념, 수학 등에서 패턴감지능력이 죄다 다를 수 있다.
3. 음악의 패턴은 잘 감지하는데 그림의 패턴은 전혀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
4. 패턴을 감지 못해도 흥분을 잘하는 인간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져서 창의할 수 있다.
5. 패턴감지력이라는 말은 없어서 설명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자시고 간에 안테나가 있어야 하는데
인간들이 상당부분 안테나가 없는듯 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테나가 없다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전에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지능이고 자시고 간에 의미가 없습니다.
1. 인간은 여러 개의 패턴을 감지하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2. 안테나에 신호가 들어오면 이를 증폭하여 흥분하고 집중한다.
3. 흥분하면 발견한 신호를 단기기억 창고에 띄워놓고 이리저리 분해하며 갖고 논다.
4. 패턴을 갖고 놀다가 다른 패턴으로 재조립하면 그게 창의다.
5. 언어능력은 패턴을 추상화하여 단기기억으로 옮기고 추론능력은 그것을 분해하여 재조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