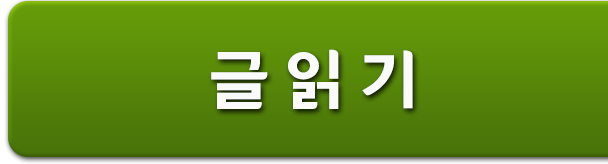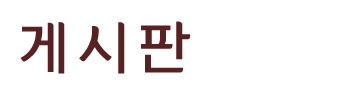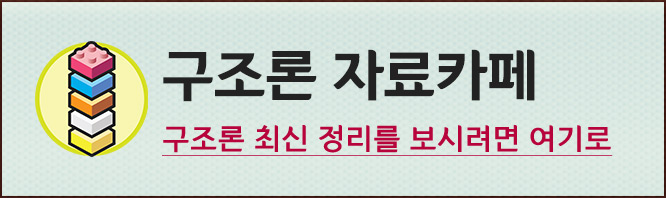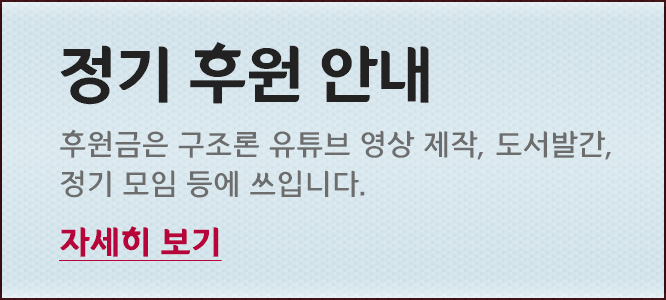아직 까마귀를 못 만든 이유 [유튜브]
| 원문기사 URL : | https://youtu.be/wrguEHxk_EI?si=CXlkcuf3u9vf9vTl |
|---|

chow 2025.05.07
숫자 인식의 방법을 보여주는데
전문적인 내용이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따구로밖에 설명을 못하나 한심하지만 그러려니 하자구요.
여기서 다루는 숫자인식은 언어모델과는 상관 없어보이지만
저게 확장되고 응용되면 언어모델이 됩니다.
숫자 모양을 보고무슨 숫자인지를 맞추는 게
뭘 의미하는 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비밀은 바로 여기에 숨어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은 한단계의 객관식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근데 생물은 반드시 두번의 객관식을 풉니다.
바깥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옆에 있는게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한번만 풉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번 하는 것도 있던데?
그래서 더 꼬이는 겁니다. 닫음의 의미를 생각하면
큰 틀은 반드시 두 개여야 합니다.
많아도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야 패턴의 정의가 성립하니깐.
괜히 이중의 역설이겠냐고요.
인간의 좌우로 갈라진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복잡한 정보를 이해할 때 쓰는 방법은
다 모아둔 다음에 외부와 내부로 가르는 겁니다.
그 경계를 찾는 게 가장 어렵고
그것만 찾으면 그 이후엔 술술 풀립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되니깐.
근데 사실 모든 알고리즘은 이 기본법칙을 따릅니다.
세상의 모든 알고리즘은 결국 분류니깐.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자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탑다운 방식이죠.
물론 모르는 것 한정입니다.
아는 걸 분류할 때는 바텀업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탑다운의 일부입니다.
안다고 전제를 하니깐.
모르는 것을 배제하고 아는 것을 남겼으니깐.
이것만 할 줄 알면 양자역학도 문제없어요~
그러려면 두 개의 통에 정보를 옮겨 담아가면서
분류가 잘 됐는 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레고블럭이라도 이리저리 끼워보는게
그게 사실은 분류라는 말씀.
깔맞춤도 분류고. 지식도 그렇게 분류합니다.
다만 단순히 둘로 가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가릅니다. 계층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는 거니깐.
그러면 하나는 형식이 되고
다른 하나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나만 이러나? 다들 그럴텐데요.
이게 바로 모든 생물의 인식법입니다.
지금의 언어모델이 바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의 한문제만 푸니깐
윗문제는 사용자에게 의존하죠.
그래서 지능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도구라고 불러야 하는 거.
인공지능은 아직 덜떨어졌소이다.
그게 바로 질문에 응답하는자의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