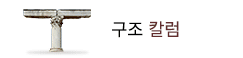|
스포츠와 예술의 경계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예술에 가까운 종목이 피겨스케이팅이다. 예술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부분과 부분을 조립하여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관객들의 마음 속에 ‘휙’ 던져주는 것이다. 그것이 날아와 내 가슴에 콱 꽂히면 파문이 일어난다. 그 방법으로 관객들이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명하는 것이다. 전율하게 하는 것이다. 갈채를 끌어내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이 그 가운데 있다. 인간이 발명한 소통의 수단은 언어와 문자다.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소통의 수단은 사랑이다. 식물은 꽃으로 소통하고 향기로 소통한다. 식물의 사랑이다. 동물은 울음소리로 소통하고 냄새로 소통한다. 동물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어떤 정수를 뽑아서 거기서 열정을 뽑아내고, 거기서 광채를 뽑아서 리듬과 템포와 칼라와 명암으로 그것을 재현해 보이면 곧 예술이다. 언어와 문자로는 약하다. 예술로서 인간은 진정 소통할 수 있다. 스포츠의 묘미는 승부에 있다. ‘누가 이기느냐’는 관심이 관객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한다.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게 한다. 그런데 스포츠가 어떤 경지에 오르면 승부를 떠나서 보여주는 기술 하나하나가 자기 이야기를 획득한다. 타이슨의 펀치, 우즈의 장타, 조던의 슛, 효도르의 공격, 지단의 조율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쾌감을 느끼게 한다. 황홀감을 느끼게 한다. 스포츠이지만 보다 예술에 가깝다 할 것이다. 그 안에는 자기 이야기가 숨어 있다. 과연 피겨스케이팅이 예술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역시 스포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느냐에 주의를 둘 수 있다. 그래도 예술은 예술이고 스포츠는 별 수 없이 스포츠인 것일까? 그 점을 지켜보는 것이다. 당신은 왜 밤새워 가며 그것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는 그렇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결이 있는지. 이야기가 있는지. 자기 논리가 있는지. 밀고 당기는 얼음과의 대화가 있는지. 그것으로 쭉 밀어붙이는 일관성이 있는지. 김연아의 연기는 독보적이다. 과거 미셀 콴이 보여준 새로운 지평의 그것에 가깝다 하겠다. 고난도의 연기를 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동작 때문에 생기는 흐름의 끊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다. 그게 예술이다. 김연아는 무엇이 다른가? 자기 아이디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해 낸다. 소화해 낸다. 말하자면 내 시합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 울려퍼지는 외침소리가 있다. 지단이라면 그렇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내 경기를 보여준다는 그것이 있다. 고집이 있다. 진정한 축구경기란 이런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 이야기가 있다. 독창적인 나의 이야기를 가져야 한다. 레파토리가 있어야 한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1사이클이 있어야 한다. 뭉클한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품어야 한다. 무대 위에서 그것을 낳아보여야 한다. 예술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그렇다. 사랑을 하든 인생을 살든 그렇다. 그것이 있어야 역사에 기록된다. 그것이 있어야 기록할 가치가 있다.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지만 동시에 미래와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www.drkimz.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