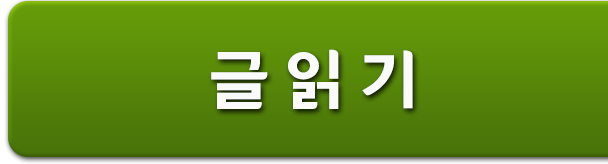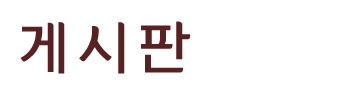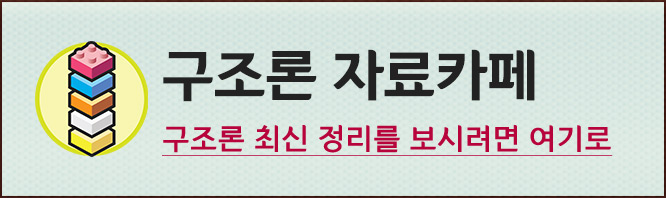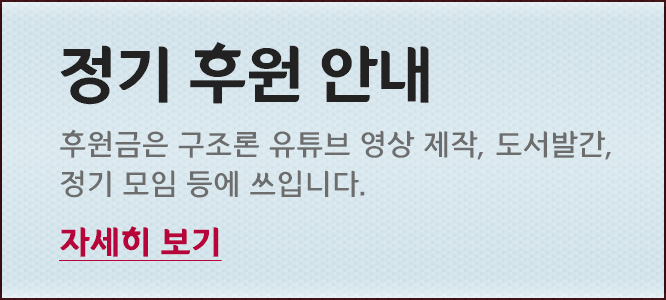물론 인간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한단계 더 나아간, 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인간은 권력이라는 고상한 걸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어떤 행위를 권력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굥이 권력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돌대가리가 무려 권력을? 권력을 추구하는 놈이 왜 쥴리한테는 꿈뻑 죽을까. 이상한 겁니다. 인간은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그 '게임'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세돌이 경쟁적으로 바둑돌을 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어떤 것을 완성시키려 할 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어쩌다보니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은 어떤 구조를 복제할 뿐입니다. 경쟁이 나타나는 것도 구조 복제를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걸 두 주체 간에 시공간이 중첩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령 진보적 인물과 보수적 인물이 한 공간을 공유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자는 상대를 보고 자신의 구조를 완성시키려 듭니다. 원숭이 두마리가 하나의 먹잇감을 두고 만나면 그들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의 방해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레고로 집을 만드려고 하는데, 형이 끼어들어서 성을 만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형은 주먹으로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키죠. 형제는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상황에서는 한쪽이 다른쪽에 굴복을 하는 걸까요? 이긴쪽이야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켰다치고, 진쪽은 완성시킬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수하거나 아니면 굴복하여 제3의 분풀이 대상을 찾습니다.
진쪽이 완전하게 승복한다면 그것은 이긴쪽을 벽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쪽이 이긴쪽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개를 꽉조여 옴짝달싹 못하게 하거나, 완벽한 방호구로 어떤 공격이라도 막게되면, 개는 굴복합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무슨 수도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들면, 그는 상대를 자신의 벽으로 삼을 겁니다. 그 순간 구조의 또다른 예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대개의 상황은 승부를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복수를 하는 겁니다. 복수는 게임이 덜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진쪽이 아직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것이 질서의 복제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어떤 질서를 반복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제한 것입니다. 은하가 어떻다거나, 인간이 어떻다는 것도, 태초의 질서를 복제한 결과입니다.
인간은 매순간 방정식의 미지수를 완성시키려 듭니다. 우리가 흔히 추론이나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방정식의 변수는 최소 3으로 구성되며, 관측자가 2를 알고 1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연립방정식은 일단 제외합시다. 그건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니깐. 이렇게 2를 알거나 있고 1을 모르거나 없는 것을 저는 에너지 상태라고 봅니다. 미지수라는 포지션은 있지만 채워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건축에서 인간을 답답하게 만든 뒤에 갑자기 개방감을 줘서 임팩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겨운 산행 끝에 정상에 올랐을 때 개방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있어야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정보를 고생 끝에 얻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거죠 똥을 참아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인간ㅇ.ㄴ 구조를 가정하고 완성합니다.
관측자는 미지수 자리에 액션을 넣든, 아이템을 넣든, 두들겨 패건, 말을 걸어보건 어떤식으로든 대입을 해봅니다. 과거에 경험이 있다면 답을 빨리 찾을 것이고, 모르면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못하면 내부에서 찾기도 합니다. 자폐증이죠. 구조는 우연히, 때론 부가 아닌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전쟁터에 던져지면 인간은 뻔해지는 거죠.
인간이 대상을 두드려 보는 것도 에너지 상태를 완성시키려는, 즉 구조를 완성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추론도 마찬가지죠. 미지수 상태를 보고 인간은 그것을 완성시키려듭니다. 뭐 인간만 그런 건 아니고, 식물이나 심지어 곤충도, 굴러다니는 돌도 그렇게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준의 정도일뿐.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을 믿는다? 목사가 괜히 신을 대상으로 권력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목사에게 절대적으로 권력질을 했으므로, 혹은 적어도 목사가 그렇게 믿으므로 목사는 그 행위를 복제하여 반복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는 보통 어릴 때 형성되며, 모든 인간은 평생 그 구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그 구조에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거죠. 부모가 사업을 했다거나 회사를 다녔다면 자식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딸이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이지 인간은 다른 인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구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걸 타인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