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렬
2015.11.24.
김동렬
2015.11.24.
노무현 때 모 대학에서
아침조회때마다 높은 사람이 오늘의 노씨개(노무현씨발놈개새끼)
한 마디씩 꼭 하고 일정 시작했다던데.
문제는 그걸 듣고 있는 교수들 중에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거.
이 나라 대학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절망적이죠.

외국 지식인-교수,기자 등등-은 90%가 진보요. 근데 한국은 말씀대로 90%가 수꼴이요. 외국에서도 한국의 이런 특이한 점이 대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의아해한다고 들었소.

교수직은 단지 안락한 삶을 위한 머스트 해브 아이템.
독재시대를 거치며, 소신있는 교수들을 대거 짤랐죠. 남은 교수들은 사학과 힘을 합쳐, 처우를 좋게 해준셈이죠.

기사에서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처음보는 사람을 멀리한다라는 말은 맞을 때도 틀릴 때도 있습니다. 마냥 멀리한다면 히치하이킹이 될 리가 없잖아요. 2,000km정도는 거뜬. 아무튼 별 상관없습니다.
북유럽은 기본적으로 인구밀도가 남쪽에 비해 낮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생존을 위한 일인당 점유면적이 넓었던 거죠. 유목민도 마찬가지. 특히 핀란드 수오미족은 아예 유목민의 후예.
인간이 안전 혹은 편하게 느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른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거리가 대개 팔이 뻗는 거리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즉각 대처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거리죠. 이는 관습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만원버스와 지하철의 등장이 이를 상당히 변화시켰겠죠. 물론 뇌에는 특수상황이란 조건을 입력하겠지만.
0.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
1.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는 거리
2. 상대방의 눈빛(의도)을 읽을 수 있는 거리
3. 상대방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로 나눌 수 있고, 가까이 올 때마다 경계태세도 등급이 높아지겠죠.
건축이나 조경을 하는 사람들은 이 거리를 잘 연구해서 반영해야할 테고.
아무튼 나와바리 면적(상대방)과 응사면적(나)의 밸런스가 사람간의 간격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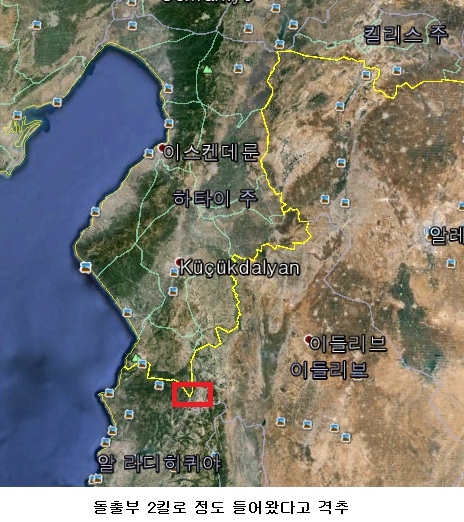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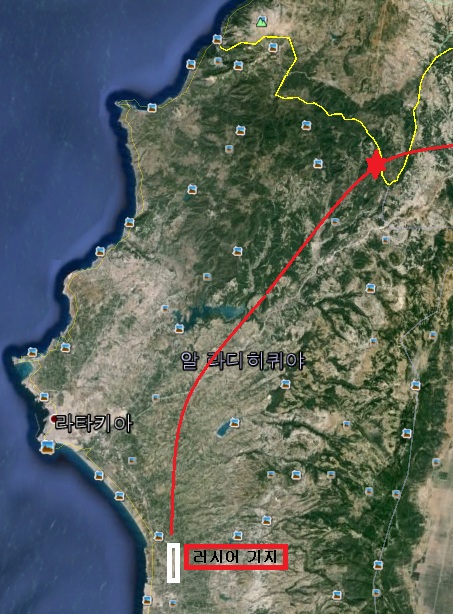










자신이 보수라는 주장을 할 정도만 되어도 양호..
절반가량은 아무 생각없이 살거나 겁이 많거나 둘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