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작을 한국에서 영화화 하면
뜨는 공식이 있다고 말했는데 전제조건이 있다.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대거 뜯어고쳐야 한다.
일본은 선종불교+도교사상이라면 한국은 대승불교+유교주의다.
일본의 선종불교와 한국의 대승불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한국의 대승은 원효사상이고 원효는 일원론+화쟁론이며 화엄사상이고 원융사상이다.
화엄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며 곧 스케일이 크게 가는 것이며
원융은 원효의 파계와 같이 구애됨이 없는 거침없는 전진을 의미한다.
일본은 작고 소박하며 개인주의고 서정적이며 모호하게 간다.
한국은 크고 대담하며 집단주의고 정치적이고 명확하게 간다.
하루키와 이창동의 차이는 정확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된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의외로 하루키의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다 쓰고 있다.
즉 이창동의 버닝은 일본식 소박함과 한국식 대담함의 어떤 균형에 도달했다는 말이다.
초록물고기나 박하사탕의 어떤 처연함과 그 주변의 탐미적인 카메라 움직임은 묘한 긴장을 자아낸다.
처연한데 아름답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아름다운데 처연하다.
하여간 너무 일본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서 망한 리틀 포레스트보다는 낫다.
일본원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이디어만 던져놓고 결말이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다.
한국변형은 올드보이처럼 어떻게든 묵직한 주제의식을 담아낸다.
강자와 약자의 대립, 사이코패스와 시골청년의 대립, 부자와 빈자의 대립
꿈과 현실의 대립, 500만원과 500만 관객의 대립. 이건 한국식이다.
용산참사가 언급되고 거시기는 불에 탄다.
그리고 유아인은 갑자기 벌거숭이 아기타잔이 되어 응애에요를 시전한다.
어쨌든 남자가 가만있는데 여자가 먼저 접근해와서 자고가는 것은 일본 방식이다.
리틀 포레스트에도 여자가 남자에게 적극 구애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해야 한다는 식으로 되면 페미니즘은 거기서 막힌다.
여자가 남자에게 들이대야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여자인 종수가 남자인 벤을 꼬셔야 이야기가 되는데
강자인 벤이 약자인 종수를 건드리니 위태로움이 그 가운데 있다.
하여간 한동안 게이영화인가 하고 봤는데 아니더라는 썰.
부자 혹은 강자 혹은 남자는 언제든 빈자 혹은 약자 혹은 여자에게 말을 붙일 수 있지만
그러므로 위태로운 것이며 반대로 빈자와 약자와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말을 걸어야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만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것이며
종수는 수줍어서 벤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몰래 미행이나 하는게 현실.
매력을 가진 약자와 권력을 가진 강자 중에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가?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야 하는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순수한 사람을 건드렸다면 죽는 수밖에.
어쨌든 당신이 종수라면 벤 앞에서 더 대담하고 뻔뻔하게 말을 걸어야 한다.
가만이 있다가 갑자기 욱해서 불을 확 싸질러버리면 그게 영화지 현실이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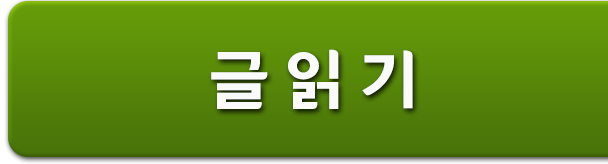










 김동렬
김동렬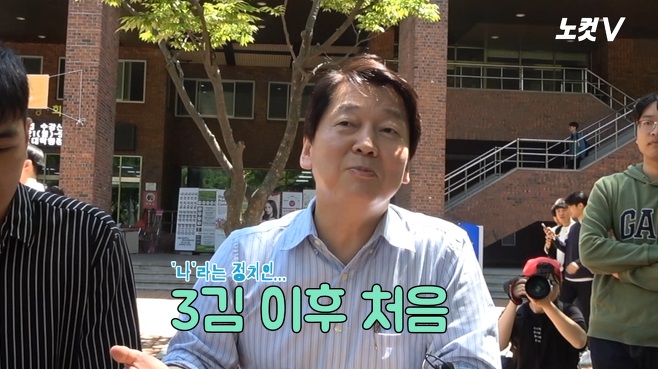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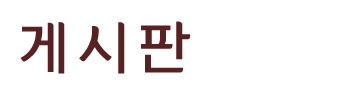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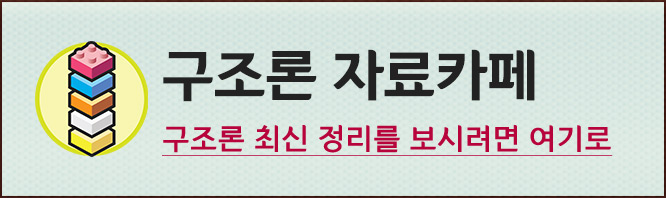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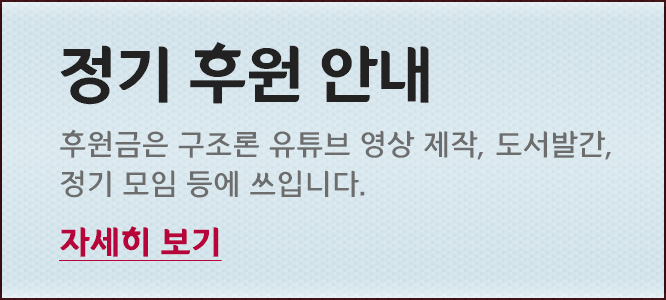


잘 읽다가 중간부터는 스포일러 같아서 읽다가 말았습니다. 영화보고 다시 읽어 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