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도리탕은 우리말 닭에 일본어 도리とり가 붙은 겹말로 알려져 있지만 겹말은 외래어가 앞에 온다. 닭도리탕이 겹말이라면 도리닭탕이 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이 우리말의 어순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어원설 수준의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역전앞은 있어도 앞역전은 없다. 사기그릇이라고 하지 그릇사기라고는 하지 않는다. 교착어는 뒷말이 앞말을 설명하므로 우리말이 뒤에 붙는다. 그냥 역전이라고 하면 역전의 전前을 궁전의 전殿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으므로 앞을 추가하는 식이다. 겹말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다. 겹말은 새로 도입된 외래어나 전문용어가 앞에 와야 한다. 콩이 먼저 있었고 새로 완두가 들어와서 완두콩이 된 것이다. 닭도리가 되려면 닭이 도리의 한 종류이거나 닭이 최근에 외국에서 새로 들어온 말이라야 한다. 외갓집은 집외가인가? 농사일은 일농사인가? 고목나무는 나무고목인가? 육고기는 고기육인가? 이오지마섬은 섬이오지마인가? 이 정도만 봐도 겹말은 외래어가 앞에 오고 우리말이 뒤에 붙어서 앞말을 설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닭도리탕이 일제의 잔재가 되려면 닭도리라는 말이 일제강점기에 널리 유행했어야 한다. 그 시대에 고도리는 몰라도 닭도리라는 말은 없었다. 닭도리가 있으면 개이누, 소우시, 돼지부타, 말으마라는 말도 있어야 한다. 개와 소와 돼지와 말은 겹말이 안 되는데 닭만 겹말이 된다면 이상하다. 일제가 일본어 사용을 강제한 것은 이차대전이 발발한 다음의 일이므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고 닭, 개, 소, 돼지, 말과 같은 일상어 사용이 강제된 것은 총독부가 1943년 3월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이후다. 게다가 도리는 닭도 아니고 새다. 일본은 생류연민령을 시행하여 육류를 먹지 않았으므로 일본에 도리탕이 없다. 콩나물, 콩국, 콩자반, 콩기름에서 보듯이 재료명이 앞에 붙는다. 닭+도리+탕은 가능해도 닭도리+탕은 불가능하다. 김치볶음밥은 김치+볶음+밥이다. 재료+조리법+요리형태 순서가 된다. 닭도리탕은 닭을 재료로 삼아 도리기 요리법을 사용한 탕이다. 겹말은 한자어와 우리말의 쓰임새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다. 육류에 생선이 포함되는지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원래 육肉이라고 하면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뜻할 뿐 어류와 조류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생선과 구분하여 육고기라는 겹말이 생겨났다. 닭도리탕은 닭고기를 도려낸 탕으로 볼 수 있다. 과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칼을 돌려가며 자르는 것이 도려내기다. 도리깨에서 보듯이 돌리는 것이 도리다. 닭도리탕은 닭고기를 채 썰거나 포 뜨지 않고 둥글게 잘라낸 탕 요리로 볼 수 있다. 종이를 가위로 자르는 것을 도린다고 한다. 닭을 통째 삶지 않고 잘라서 익혔다는 뜻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가운데 오는 말은 조리법이다. 경상도 사투리로 닭을 달이라고 하므로 달도리, 달달이가 되는데 겹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채므로 어색하다. https://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56 1920년대 문헌에서 꿩도리탕, 토끼도리탕이 발견되어 논란을 종결시켰는데도 국립국어원이 승복하지 않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 때문이다. 짜장을 자장이라 우겨야 속이 편한 모양이다. 그럼 깐풍기는? 라조기는? 류산슬은? 곤란하다. 1920년은 일본문화가 조선사회에 깊이 침투하기 전이므로 1910년대에 닭도리탕이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재빨리 일본어가 붙어서 1920년 문헌에 등장할 수 없다. 국립국어원 주장이 약간의 타당성을 얻으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본어 도리가 한국어 닭과 붙은 닭도리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 4. 닭도리탕이 생겨난 직후에 바로 꿩도리탕, 토끼도리탕이 만들어진다. 닭도리라는 겹말이 만들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이전에는 일본어에 익숙해질 수 없으므로 국립국어원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 한심한 것은 볶음이면 볶음이고 탕이면 탕이지 볶음탕은 또 뭐야? 한식요리에 이런 식의 요리명이 없다. 닭도리가 있으면 개이누도 있어야 하듯이 볶음탕이 되려면 볶음국도 있어야 한다. 이러다가 불닭볶음탕면도 나올 판이다. 깍두기는 깎둑 썰고 닭도리는 도려 자른다. 도리는 조리법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국립국어원은 도무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언어진화론이 있다. 언어가 진화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언어는 보디사인에서 진화한다. '나'는 턱을 당겨 자신을 가리키고 '너'는 턱을 밀어서 상대를 가리킨다. My와 Me는 입술을 오므려 자기를 가리키고 You는 입술을 내밀어 상대를 가리킨다. 파더는 마더를 반대로 발음한 말이고 아빠는 엄마를 반대로 발음한 것이다. 마더와 엄마가 파더와 아빠보다 먼저 생겼고 이는 아기가 젖을 먹으며 입술로 젖꼭지를 무는 동작에서 나왔다. 대다수의 어휘를 궁극적인 단계까지 어원을 추적할 수 있다. 부바키키 이론이 증명한다. 인도유럽어는 진화의 경로가 규명되어 있다. 학계의 자의성설은 틀렸다. 뿌리없이 그냥 등장하는 어휘는 없다. 언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아이디어는 쉽게 생겨나지 않으며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더 많은 어원 자료는 https://cafe.daum.net/gujoron |

국립국어원은 근본이 돌대가리 집단입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4&seqNum=1545
띄어쓰기 원칙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례에 대한 것만 있고
정작 원칙이 없는 개판 원칙.
'원칙'의 의미를 잘 모르는듯.
띄어쓰기의 핵심은 '의미전달의 용이성'이 되어야 하고
의미전달이 용이하다는 것은
1. 주동목 형태가 잘 드러나거나
2. 자주 사용하여 명사화가 되는 것은 붙여쓰게 하거나
3. 다른 단어와 의미를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은 띄어써서 화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원칙의 의미도 모르는 돌대가리들이 사례로 원칙을 만들어서 개판.
세종대왕한테 쳐맞아야 해결될듯.
덧붙여,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문단을 나누는 것도 띄어쓰기와 같은 원리를 공유합니다.
문단을 나눌 땐 의미 단위로 나누어야 독자가 읽기 쉬워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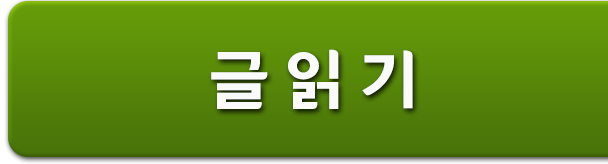





 김동렬
김동렬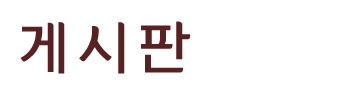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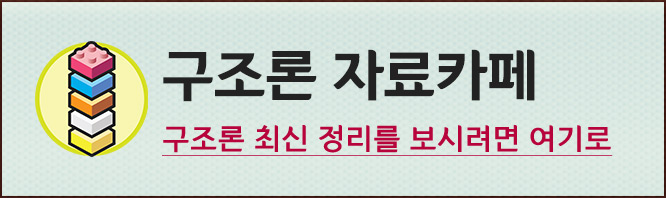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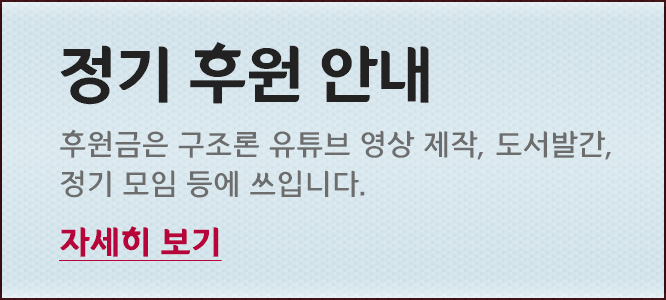


한일중ㅋㅋㅋ